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쓴 연구서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공공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린 제니스 존슨은 새집을 2주 안에 구해야 했다. 흑인 싱글맘인 데다 복지수급자여서 세를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업자가 좋은 매물이라며 주택 한 곳을 보여줬지만, 선뜻 마음에 들진 않았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했다. 존슨은 서둘러 계약했다. 돈은 필라델피아 연방주택청이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충당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대출금이 연체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획기적인 대출이었다. 그는 5천800달러를 대출받아 1970년 9월18일 생애 첫 주택을 구매했다. 그러나 그 주택은 불량품이었다. 이사한 지 며칠 만에 하수관이 고장 나 지하실이 물바다가 됐고, 전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제멋대로였다. 최악은 쥐들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이었다.

[EPA=연합뉴스]
미국 프린스턴대 키앙가야마타 테일러 교수가 쓴 ‘이윤을 향한 질주'(원제: Race for Profit)는 정부의 방관 속에 부동산 업자와 모기지은행이 어떻게 ‘공정주택법’과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렸는지, 또한 어떻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착취했는지를 조명한 연구서다.
책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68년 제정된 공정주택법 등을 토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출을 실시하자 부동산 중개인과 모기지 대출기관이 새로운 고객에 눈독을 들였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하고, 대출이 줄어들고 있었다. 업계로선 신규 고객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 보증을 등에 업은 흑인이 수요자로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집을 사고파는 데 익숙한 백인보다 집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가난한 흑인’들은 그들에게 손쉬운 상대이자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간 흑인들을 배제해왔던 부동산업체와 모기지은행은 흑인들에게 집을 소개하고, 돈을 대거 빌려줬다.
저자는 이를 ‘약탈적 포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택 매수자가 기존의 부동산 관행과 모기지금융에 대한 기회를 더 비싸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으로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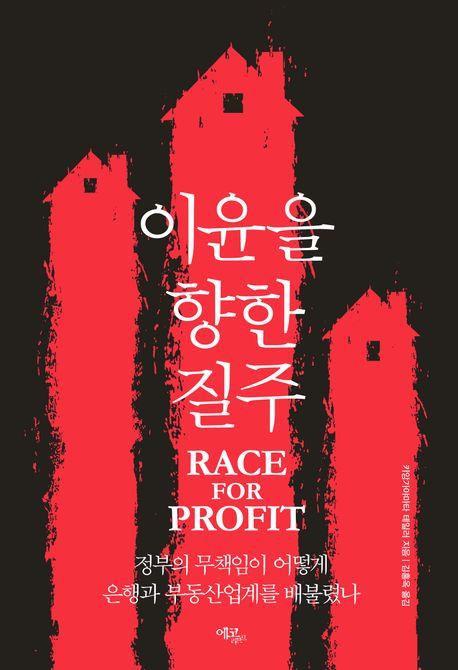
[에코리브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실제로 제니스 존슨과 같은 사례가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수 발생했다. 한 투기꾼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물을 1천800달러에 매수한 뒤 450달러를 들여 수리한 후 4개월 뒤,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흑인 가족에게 2만달러에 되팔았다. 흑인 가족이 이사 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 보일러와 화장실이 고장 났다. 이런 사례는 1970년대에 많이 발생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이처럼 정부의 선의는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신 시장은 이윤과 인종차별을 선택했다. 백인 주택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흑인 인구의 백인 지역 유입을 저지하거나 최소 분리해야 한다는 시장의 믿음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소홀, 흑인공동체와 흑인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벌인 업계의 “사기 행각”, 전례 없을 정도로 주택 시장에 쏟아진 정부자금, 이런 요소들이 한 덩어리로 어우러진 결과, 부도덕한 사업 관행이 활개를 쳤다.
시장은 분리를 택했고, 부동산업계는 백인들이 거주하는 교외 지역보다 인프라가 노후하고, 학군도 좋지 않은 지역으로 흑인들을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가난한 흑인들은 “어수룩한 매수자”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이후 시장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2018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인 50% 이상이 거주하는 동네의 주택가격은 흑인 비거주 동네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저자는 “미국 주택시장에는 부동산업체, 주택업계, 은행업계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차별이 내재해 있다”며 “지난 100년 동안 주택시장이 인종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된 시기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에코리브르. 김홍옥 옮김. 584쪽.
buff27@yna.co.kr